1) 발단 — 왜 대공황이 일어났나 (구조적·촉발 요인)
대공황은 단일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으며, 구조적 취약성(장기적) + 촉발 사건(단기적) 이 결합되어 발생했습니다.
구조적 취약성
- 과도한 신용(레버리지)과 개인·기업의 부채 확대: 1920년대 대중의 신용확대(할부구매·마진거래 등)가 소비와 투기를 부추겼습니다.
- 소득 불균형: 소득이 상층에 집중되어 대다수의 구매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생산능력은 계속 늘어났습니다(과잉생산).
- 농업의 장기적 위기: 전쟁 수요 붕괴 후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고 농민 부채가 누적되어 소비력이 약화되었습니다.
- 금융 규제·감독의 미비: 은행·증권시장 감독이 약해 위험자산과 불투기 행위를 충분히 막지 못했습니다.
- 국제금본위제(금본위제)의 제약: 각국 통화정책이 금 보유에 묶여 유연한 대응이 어려웠습니다.
촉발 요인
- 1929년 가을, 주식시장의 대폭락(“검은 목요일·월요일·화요일”) — 투매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금융·신용 시장이 급격히 수축.
- 주가 붕괴로 자산가치가 급락하자 담보가치가 줄어 대출이 회수되고 은행·기업의 연쇄부실 초래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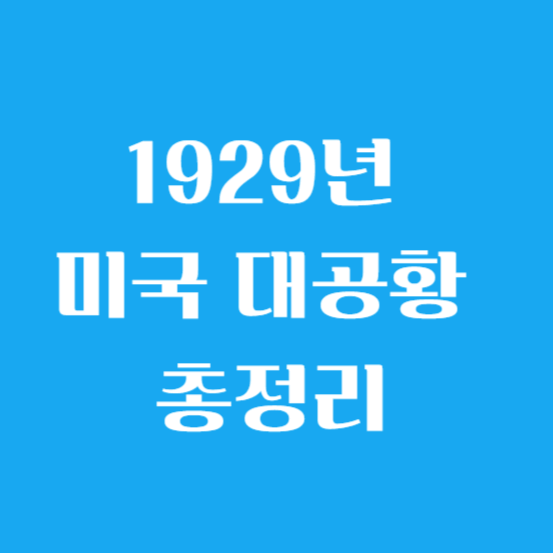
2) 전개 — 1929~1939 연대기와 핵심 사건 (연도별로)
아래는 중요한 연도별 사건과 그 의미를 정리한 것입니다.
1929 (붕괴의 해)
- 10월: 증시 대폭락. 단기간의 패닉 셀링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됨. 주식시장은 매우 높은 수준에서 단기간에 큰 폭 하락.
1930
- 미 의회는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스무트-호리 관세법(Smoot–Hawley Tariff)을 통과시킴(1930). 이로 인해 국제무역이 줄고 다른 나라의 보복관세가 이어져 세계 무역이 급감, 각국의 경기악화 악순환 촉진.
1929~1933 (금융 붕괴와 경기 수축)
- 수천 개의 은행이 파산했고(수치: 수천 개, 약 1929~1933년에 걸쳐 6천~9천 개 수준의 은행 실패 사례가 보고됨), 신용이 급격히 위축됨.
- 산업생산·투자·소비가 크게 줄고,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(미국에서는 최고 약 25% 수준). GDP는 큰 폭으로 감소(대략 수십 퍼센트대 감소).
1932
- 경기 저점이 도달. 허버트 후버 대통령의 재선 실패(대중의 불만 표출).
1933 (루스벨트 취임과 즉시 조치)
- 프랭클린 D. 루스벨트 취임(1933.3). 초기에 은행 휴업(Bank Holiday)을 선언하여 은행 시스템의 붕괴를 막고 신뢰 회복을 시도.
- ‘뉴딜’의 첫 단계(First New Deal)가 시작되어 다수의 긴급 법안과 행정조치가 단기간에 통과/집행됨.
1933~1936 (부분적 회복)
- 공공사업·일자리 창출·금융제도 개혁 등으로 경제지표가 일부 개선됨. 그러나 회복은 불균형적이고 완전하지 않았음.
1937 (재침체)
-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이려 하거나 통화정책을 긴축(연방준비제도(Fed)의 통화정책 변화 포함)하면서 경기회복이 꺾여 재침체(1937–1938 recession)가 발생. 이로 인해 뉴딜의 한계가 드러남.
1939 (전시수요의 증대)
- 유럽에서의 전쟁 발발(1939)은 군수수요를 촉발하면서 미국 산업생산이 본격적으로 증가 —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 완전한 고용·생산 회복의 결정적 계기가 됨.
3) 정책 대응: 후버 vs 루스벨트
후버(1929–1933)
- 전통적으로 ‘시장 신뢰 회복’과 ‘자발적 협력’에 의존: 민간 구호·자발적 임금감축·기업협조 촉구 등.
- 1932년에는 재정·금융 개입(예: RFC — Reconstruction Finance Corporation)을 확대했지만 시기상 늦고 규모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음.
루스벨트(1933–) — 뉴딜(New Deal)
뉴딜은 크게 응급구제(Relief) → 경기부양(Recovery) → 구조개혁(Reform)의 3대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. 뉴딜은 단계적으로 전개되며, 보통 First New Deal(1933–1934)와 Second New Deal(1935–1936)로 구분됩니다.
4) 뉴딜의 주요 프로그램(기관·법안) — 목적과 작동 방식, 성과·한계
(각 항목에 대해 무엇을 했고 왜 했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.)
금융 안정화
- 은행 휴업(Bank Holiday, 1933): 모든 은행을 잠시 문 닫게 하여 예금인출 사태를 멈추고 재정비한 뒤 건전한 은행만 재개업토록 함. 국민 신뢰 회복 목적.
- FDIC(연방예금보험공사, 1933): 예금을 보험으로 보호, 예금인출 공포를 줄여 은행업 안전성 제고.
- SEC(증권거래위원회, 1934): 증권시장의 투명성·공정성 확보(공시·사기 행위 규제).
고용·공공사업(Job creation / Infrastructure)
- CCC(Civilian Conservation Corps, 1933): 청년층에 임시 일자리 제공(산림·보호·토목 관련). 자연자원 보존과 고용 제공 목적.
- PWA(Public Works Administration): 연방 예산으로 대형 인프라(댐·교량·학교 등)를 건설하여 고용과 투자 촉진.
- WPA(Works Progress Administration, 1935): 보다 광범위한 공공사업·문화사업(예: 예술가·작가 고용 포함)을 통해 대규모 일자리 제공. (WPA는 Second New Deal의 대표적 프로그램 중 하나)
- TVA(Tennessee Valley Authority): 테네시 계곡 지역의 전력·홍수통제·지역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력보급.
농업·공업 조정
- AAA(Agricultural Adjustment Act, 1933): 농산물 과잉생산 억제(감산)·가격 지지(보조금 지급)로 농가소득 보전. 결과적으로 일부 성공했으나 농지사용 조정 등으로 논란도 발생.
- NRA(National Recovery Administration, 1933): 산업별 코드(code)를 통해 임금·생산·가격을 조정하여 ‘공정 경쟁’ 도모. 그러나 1935년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제도 유지에 한계.
사회보장 및 노동권
- 사회보장법(Social Security Act, 1935): 노령연금·실업보험·무능력자 지원 등 현대적 사회안전망의 기초 마련.
- 와그너법(National Labor Relations Act, 1935): 노동자 단결권·단체교섭권 보장(노동조합 강화) — 노동자 정치적·경제적 지위 변화 촉진.
기타
- 통화·금융정책: 연준의 역할과 통화정책의 한계가 논쟁거리였음. 루스벨트는 금본위제와의 결별 등을 통해 통화 유연성을 확보하려 함(금 보유와 환율정책 변화).
성과와 한계
- 성과: 금융제도 안정(예금자 신뢰 회복), 일부 산업·지역의 회복, 공공사업을 통한 고용·사회 인프라 확충, 사회보장제도의 제도화 등.
- 한계: 실업률을 정상 수준으로 낮추지 못했고(완전회복은 전시수요가 결정적), 인종·지역별 불평등은 지속, 일부 정책(NRA 등)은 법적·실행상 문제를 겪음. 정부지출과 개입에 대한 보수적 반대도 강했음.
5) 회복의 동력 — 왜 완전회복은 전쟁(1940년대)에서 왔나
- 1930년대 중후반 뉴딜이 경기회복을 도왔으나 미국이 완전고용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던 이유는 민간투자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했고 국제수요가 약했기 때문입니다.
- 제2차 세계대전(1939~)에서 군비확대는 대규모의 공업생산과 고용을 창출하여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산업생산을 급증시켰습니다. 결국 전시경제가 실질적·완전한 회복을 가져왔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.
6) 국제적 파급 — 대공황은 세계적으로 어떻게 퍼졌나
- 미국의 수요감소·금융경색은 유럽 등 다른 국가들의 수출·금융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.
- 금본위제 하에서 자본과 금의 흐름은 각국의 통화·금융정책을 제약했고, 그 결과 여러 국가에서 은행파산·실업·정정 불안이 연쇄적으로 발생했습니다.
- 정치적으로는 극우·극좌 세력(예: 파시즘·강경 민족주의)의 부상에 일부 영향을 미쳤습니다(경제 불안이 정치적 극단화를 촉진).
7) 역사적 해석과 논쟁
학자들은 대공황의 원인·해법·뉴딜의 효과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습니다.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1. 케인스주의적 해석: 수요부족이 결정적이며,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(지출 증가)이 필요하다고 봄. 뉴딜이 수요 창출에 기여했다고 평가.
- 2. 통화학파(예: 밀턴 프리드먼) 해석: 연준의 통화 공급 축소(통화수축)가 위기를 심화시켰다고 봄. 금본위제와 통화정책의 실패를 강조.
- 3. 제도적/구조적 관점: 재분배·노동시장·금융 구조의 취약성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보는 시각.
- 4. 비판적 관점: 뉴딜이 일부 구조개혁을 이루었으나, 보수적 요소(예: 기업·지주 보호)와 인종·계층적 불평등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판.
8) 대공황이 남긴 제도적·사상적 변화
- 사회안전망의 제도화: 사회보장제도, 실업보험 등 현대 복지국가의 기초 형성.
- 금융규제와 감독 강화: 예금보험(FDIC), 증권감독(SEC) 등 현대 금융안전장치의 출현.
- 국가의 역할 재정의: 위기 대응에서 정부의 적극 개입과 재정정책·사회정책의 정당성 확대(케인스주의의 확산).
- 노동권 강화: 노동조합의 성장과 집단교섭권 보장.
- 통화체제 변화: 금본위제의 약화·폐기 논의와 더 유연한 통화정책의 필요성 부각.
9) 오늘에 주는 교훈(정책적·정신적)
아래는 현대적 상황(예: 2008년 금융위기, 2020년 코로나 대응)에도 적용 가능한 핵심 교훈입니다.
1.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가 우선
→ 예금보험, 자본완충, 감독 규칙은 위기 확산을 막는다.
2. 위기 시 신속하고 충분한 정부 대응(재정·통화)
→ 수요붕괴를 막기 위한 적극적 재정지출과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중요하다.
3. 국제협력의 중요성
→ 보호무역(관세전쟁)은 수요를 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글로벌 공조가 필요하다.
4. 사회적 안전망은 경제 안정장치
→ 소득안정장치(실업보험 등)는 소비 붕괴를 막아 경기하강을 완화한다.
5. 심리(신뢰) 관리의 중요성
→ 정부의 신뢰성·투명한 정책 커뮤니케이션이 공포를 완화하고 회복을 촉진한다.
6. 구조적 취약성의 사전 해소
→ 불균형(소득·부채·지역 격차) 해소는 장기적 리스크 감소에 필수.
2025.11.05 - [생활경제정보] - 금 ETF 매수 분석과 폭락장에도 사들이는 원인 6가지
금 ETF 매수 분석과 폭락장에도 사들이는 원인 6가지
한눈에 요약 (핵심 포인트) 1. 국제 금값이 10월 말~11월 초에 급락해 온스당 $4,00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. 2. 한국에서는 같은 기간 KRX 금현물 가격이 크게 조정됐고, 그 와중에도 금 관련 ETF에 약 1,5
1.progress-joo.com
10) 비판적 시사점과 한계
- 뉴딜은 중요한 제도적 진전을 이뤘으나 완전한 경제 회복을 가져오지 못했고, 일부 정책은 법적·운영상 한계와 불평등 문제를 초래했습니다.
- 또한 국가 개입의 확대는 정치적·이념적 반발을 낳았고, 특정 집단(예: 소수인종, 흑인 농민 등)은 정책의 수혜에서 소외된 사례가 많았습니다.
'생활경제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금 ETF 매수 분석과 폭락장에도 사들이는 원인 6가지 (0) | 2025.11.05 |
|---|---|
| 요즘 핫한 한국 반도체 ETF 2종목 알아보기 (0) | 2025.11.03 |
| AI 버블과 닷컴 버블 유사성과 다른 점 (0) | 2025.10.30 |
| 2차전지주 다시 급등하는 이유 (0) | 2025.10.28 |
| 금값 급락 원인(김치 프리미엄과 환율) (0) | 2025.10.23 |



